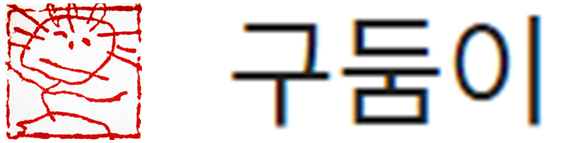감에 대한 작업을 늘 숙제로 남겨두다가 우연찮게 시도했던 100호 작품인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완성이 되고 말았다.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야 할 작업이다.
곶감의 고장 상주,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늘 감을 접하게 된다. 운동삼아 거니는 뒷산에는 감나무 밭도 꽤 있어서 사철 감나무들의 변신을 관찰할 수있다. 그 중에는 별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한겨울에 홍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 데 감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은 마치 한겨울에 핀 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끔은 새가 쪼아먹어서 가운데가 푹 파인 홍시의 잔해(?)에 눈이 소복히 쌓인 진풍경을 보게 될 때도 있다.
.
2018년에 큰 그림을 걸 수 있는 행사가 있었다. 그 행사에 맞추어서 작은 겹 종이판 수십 개를 덧 이으면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얼개로 오랫동안 마음먹고 꾸준히 마련했었다. 그런데 반도 못 만들어서 그림 거는 날짜가 닥치고 말았다. 더구나 종이 판들을 이어서 짜 맞추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것을 옮기고 거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다 캄캄하였다.
해오던 것들을 모두 멈추었다. 이제까지 해 온 것들만 가지고라도 얼른 캔버스(100호 F)에 붙여서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일하기도 좋고 어디에나 걸어도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캔버스다.
그런데 작은 종이 판들을 캔버스에 빽빽하게 늘어놓아보니 아구맞춤이 되질 않았다. 바탕 빈 곳의 넓이를 따져가면서 성글게 늘어놓으니 너무 어수선했다. 요리조리 늘어놓아보니 차라리 바탕을 많이 비우고 몇 개만 붙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캔버스에 오방색으로 바탕을 깔고 그 위에 종이 판들을 얹어서 붙이고 마무리를 하였다. 하다 보니 생각도 못했던 엉성한 그림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승현 감 풋감ㅣ판지에 아크릴물감 21×21cmㅣ2018 (0) | 2021.10.20 |
|---|---|
| 이승현 감 풋감3ㅣ판지에 아크릴물감 21×21cmㅣ2018 (0) | 2021.10.20 |
| 이승현 감 꽃감24ㅣ판지에 아크릴물감 21×42cmㅣ2018 (0) | 2021.10.20 |
| 이승현 감 꽃감23ㅣ판지에 아크릴물감 21×42cmㅣ2018 (0) | 2021.10.19 |
| 이승현 감 꽃감22ㅣ판지에 아크릴물감 21×42cmㅣ2018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