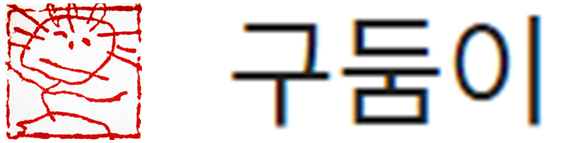장의사에서 나뭇결에 금이 가 가치가 떨어진 관을 샀다. 전시장 바닥에는 시대를 알리는 신문을 깔았다. 관에는 각종 잡동사니,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할 만한 물품들과 일상의 물품 중에서도 내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거북스러운 것들을 넣었다.
그리고 화투의 솔광, 사꾸라광, 똥광, 비광, 달광 등을 가위질해서 처넣었다. 배경에 있는 아이 그림은 당시의 주요 사건을 다룬 신문 위에 그렸다. 당시의 혼란스럽고도 모순된 삶을 살았던 나의 상태가 드러난 작업들 중 하나이다.
당시는 폭압적인 정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왜곡되던 시기였었다. 모순된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하여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 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소리(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였지만 찾을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에는 풍물이나 탈춤에 대한 연구는 급진적인 운동권에서나 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겼었다.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런 인물을 가까이하면 신분상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던 시기였다.
평범한 작업을 하는 나약한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마치 면벽 벌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학습된 무기력이 이미 나에게 배어 있었고 그 무기력하고도 한심한 내 모습에서 느끼는 분노는 늘 내 무의식 속에 속에 깔려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건 아닐까.
----------------------------------------------------
- 그 전 이야기
좀 더 어릴 적, 20대 초( 2학년)에 조소 실기실에서 작업하던 때 이야기다. 이때는 카세트라디오가 훌륭한 벗이었다. 듣거나 말거나 그냥 배경음향으로 늘 틀어놓고 작업을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무심코 흘려듣는 중에 상여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무슨 연속극이었던 같다. 극 중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사와 함께 아련히 들여오는 요령 소리, 그 소리에 묻힐 듯 말 듯 간간히 들리는 상둣군의 구성진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얼어붙는 듯했다.
마치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 무엇인가가 울려 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꼭 내고 싶은 소리를 누군가가 대신 내 주기라도 하듯이...
처음 듣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 그 가락은 내 마음에 절절하게 와 닿았다. 이렇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우리 소리는 어려서 들었던 자장가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았다.
당시에는 우리 가락보다는 팝송과 클래식이 늘 익숙했던 시절이었다. 우리 문화를 은연중에 비하하면서 미국 중심 서구문화를 중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이들은 팝송이나 서양의 명화 음악 아니면 요즘 말하는 7080가요에 열광하는 편이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팝송, 샹송, 칸쏘네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 즐겨 들었고 클래식의 매력에도 흠뻑 빠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것에 집착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연한 그리움은 떠나지 않았고 나는 늘 막연한 그리움에 목이 말라 있었다.
그렇게 찾으며 애태우던 나에게 그 순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속으로 외쳤다. 잊을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나는 모든 것 잊어버리고 오로지 소리에만 빠져들었다
불과 4~5분 밖에 안 되는 그 순간이 깊은 감동으로 남아서 평생 내 가슴속에서 물결치고 지금도 이렇게 나를 흔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승현 설치작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승현 소리-굿1ㅣ설치작업 혼합재료 200×200×300cmㅣ2002 (0) | 2020.08.07 |
|---|---|
| 이승현 설치용 소품ㅣ돌멩이 노끈 26×9cm 7점ㅣ2002 (0) | 2020.08.06 |
| 이승현 토우 3×7×8cm 12점ㅣ1991 (0) | 2020.06.19 |
| 이승현 세상 사는 소리들 (설치)광목에 혼합재료ㅣ 110×300×220 cm ㅣ 1985 (0) | 2020.05.27 |
| 설치작품 : 소리-굿 (0) | 2012.04.24 |